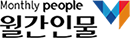1994년, 미국은 남자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른 뒤 “대회가 끝나도 축구가 남는 나라가 되겠다”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미연방 축구연맹(USSF)은 월드컵 유치를 위해 FIFA에 ‘1부 프로리그 창설’을 약속했고, 이 약속의 이행은 시대적 당위가 되었습니다. 1995년 여자 월드컵 3위(이후 1999년 자국 대회 우승)로 대중적 관심이 고조되자 “남녀 모두에게 프로의 토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1996년 메이저리그 사커(MLS) 출범으로 약속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범 초기, 리그는 곧바로 생존의 기로에 섰습니다. 다음 해법은 ‘정체성’부터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승부수: 하드웨어의 독립, ‘축구 전용구장’
거대한 미식축구(NFL) 또는 야구(MLB) 경기장을 빌려 쓰는 방식은 텅 빈 관중석을 노출해 초라한 이미지를 만들었고, 구단은 잔디 관리, 일정, 식음료, 주차 등 부대 수익을 통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를 끊은 첫 해법이 ‘축구 전용구장(Soccer-Specific Stadium)’이었습니다. 1999년 미국 역사상 첫 축구 전용구장인 Historic Crew Stadium(콜럼버스)이 문을 열며 구단이 자립적 수익 모델을 설계할 길이 열렸고, 2000년대 이후 도심 생활권에 1만8천~3만 석 규모의 “작지만 꽉 찰 수 있는” 경기장들이 들어섰습니다. 2025년 현재 30개의 MLS 구장 중 22곳이 축구 전용이라는 사실은, 이 전략이 MLS의 첫 번째 '게임 체인저'였음을 증명합니다.
인프라가 갖춰지자, 이제 그 위에 수요를 끌어당길 ‘콘텐츠’가 필요해졌습니다.
두 번째 승부수: 소프트웨어의 진화, ‘스타 시스템’의 설계
견고한 하드웨어 위에는 흥행을 견인할 ‘슈퍼스타’라는 강력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MLS의 딜레마는 분명했습니다. 1세대 리그(NASL)가 무분별한 스타 영입 경쟁으로 파산했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리그는 엄격한 '샐러리캡'(당시 약 200만 달러대)을 고수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은 지켰지만, 이는 곧 '스타 부재'라는 치명적인 한계와 동의어였습니다.
이 딜레마를 푼 묘수가 2007년 도입된 '지정선수(Designated Player)' 제도, 일명 '베컴 룰'이었습니다. 이는 리그의 샐러리캡 골격은 유지하되, 구단이 감당할 수 있는 1~3명의 슈퍼스타 연봉(초과분)은 예외로 두는 '캡 안의 예외' 설계였습니다. 데이비드 베컴(LA갤럭시)이 이 제도의 성공 가능성을 입증한 첫 사례가 되자, 티에리 앙리, 카카, 즐라탄 이브라모비치 등이 그 뒤를 이으며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이 흐름은 2023년 리오넬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 합류로 질적인 도약을 이룹니다. 메시의 등장은 티켓, 머천다이즈, 시청 지표 등 모든 산업 수치를 폭발시켰습니다. 그리고 2025년, 역대 최고 이적료로 합류한 손흥민(LAFC)의 성공은 '북미 내수'에 '글로벌 수요(아시아)'를 결합하는 성숙한 구조로 리그가 진입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슈퍼스타들이 불러일으킨 이 폭발적인 관심을 '일상의 소비 습관'으로 굳히기 위해, MLS는 팬이 경기에 닿는 접점을 단순하고 강력하게 재설계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세 번째 승부수: 소비 습관의 완성, ‘미디어’와 ‘콘텐츠’
2023년, MLS는 애플(Apple)과 10년 단독 글로벌 스트리밍 계약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과거 지역 방송과 전국 방송으로 파편화되어 팬들조차 자기 팀 경기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중계 환경을, '블랙아웃(중계 제한)' 없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경기를 본다”는 단순하고 강력한 모델로 통합한 것입니다.
이렇게 팬과의 접점을 정비하는 동시에, 리그는 새로운 핵심 콘텐츠를 공급했습니다. 멕시코 리가 MX(Liga MX)와의 '리그스 컵(Leagues Cup)'을 매년 여름, 리그를 중단하고 치르는 한 달간의 대회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미 축구의 가장 뜨거운 라이벌전을 매년 즐기는 매력적인 '시즌 이벤트'로 팬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미디어 접점이 통일되고 새로운 볼거리가 자리를 잡자, 이제 이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채워줄 '공급', 즉 꾸준한 선수 수급이 다음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네 번째 승부수: 지속가능성의 확보, ‘유스’와 ‘자본’
한때 미국 유소년 축구는 고비용의 'Pay-to-play' 모델이 지배해 재능보다 경제력이 우선시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2007년 USSF의 디벨롭먼트 아카데미(DA)가 출범했고, 2020년 MLS가 이를 MLS NEXT로 계승했습니다. 2022년에는 리저브 리그 성격의 MLS NEXT Pro까지 창설하며, 1군–리저브–유스를 잇는 수직적 경로를 완성했습니다.
특히 2008년 도입된 '홈그로운 룰'과 다수 구단이 운영하는 '무상(Free-to-play)' 아카데미는 이 고질적인 비용 장벽을 낮추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유망주들이 비용 부담 없이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되면서 10대 후반~20대 초반의 미국 선수들이 MLS와 유럽 5대 리그를 자유롭게 오가는 '양방향 인재 흐름'이 일상화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같은 시기 미국 자본이 유럽 구단 투자를 확대하며 미국 축구 시장에 '역방향 학습효과'를 제공했다는 사실입니다. 글레이저 가문(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SG(리버풀)를 비롯해 최근 레드버드(AC 밀란), 오크트리(인터 밀란)에 이르기까지 미국 자본은 유럽 빅클럽 운영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유럽의 성숙한 시장에서 체득한 지배구조와 재무 기법은 MLS의 투자 판단, 리스크 관리, 수익 다각화에 실무적인 레퍼런스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증명의 무대
2026년, 지구 최대의 쇼가 32년 만에 '홈'으로 돌아옵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이번 대회에서 미국은 8강전 이후(준결승, 결승 포함) 모든 핵심 일정을 소화하며 핵심 개최지 역할을 맡습니다. 1994년 월드컵이 MLS라는 ‘약속’을 잉태시켰다면, 2026년 월드컵은 그 약속이 30여 년 만에 ‘일상’으로 완성되었음을 증명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결국 1994년의 약속은 인프라(전용 구장), 수요(스타 시스템), 접점(단일 미디어), 그리고 공급(유스 및 자본)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콜럼버스에서 시작된 하드웨어의 독립, '베컴 룰'로 대표되는 선택과 집중, 애플 중계와 리그스 컵을 통한 소비 습관의 설계, 그리고 MLS NEXT로 완성된 인재 파이프라인이 그 톱니바퀴를 채웠습니다.
그렇기에 2026년 월드컵은 이 톱니바퀴가 거대한 압력과 변수 속에서도 견고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마지막 점검대'이기도 합니다. 물론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미디어·초상권·데이터 등 각종 권리와 보상의 문제, MCO(멀티 클럽 소유) 환경에서의 이해상충, 국제 이적 및 유스 보상 시스템 등 '보이는 성과' 이면의 '보이지 않는 계약과 거버넌스'를 정교하게 정렬하는 일입니다.
그때 비로소 미국은 "대회가 끝나도 축구가 남는 나라"를 넘어, 대회 이후에도 매일 성장하는 거대한 시장임을 증명할 것입니다.